희망버스에 대해 이렇게 나약하고 개인적인 고백을 늘어놓아도 될지 조심스럽다. 희망버스가 사회운동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희망버스에 운동세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정리해고가 노동계급을 어떻게 분할시키고 있나 등등, 여러 토막들이 떠오르지만 정작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의미들이 아니다.
2003년 11월, 곳곳에서 김진숙씨의 추모사를 들으며 울먹였던 노동자대회 전야제 그 밤과, 서울 시내를 벌겋게 물들였던 하지만 무참히 무너졌던 노동자대회 그 밤을 잊지 못한다.
 |
김진숙씨가 어느 강연에서 김주익 열사가 돌아가시기 전, 짬뽕을 먹고 싶다 해서 크레인 밑에서 줄에 매달아 올리는데 국물이 다 쏟아져 결국 올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던 걸 잊지 못한다.
난 그 때까지 2003년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혼자 아픔은 다 겪은 것 마냥 궁상을 떨었더랬다. 김진숙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찔끔거리며 저 이는 어쩌면 저렇게 강할까, 저 이는 어쩌면 저토록 끄떡없이 버틸까, 철없이 품었던 동경들. 그러다 김진숙씨가 두 열사의 죽음 이후 방에 불을 때지 않고 지내왔다는 말을 듣고서 아득해지던 그 막막함을 잊지 못한다.
 |
작년 겨울, 김진숙씨가 맨 길바닥에서 노숙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처음 가졌던 생각은 부끄럽게도 내가 저렇게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었다.
크레인 강제진압이 예고되었던 6월 말, 소식을 듣고서는 온 몸이 축 쳐져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보냈다. 난 사실 여태 소금꽃 나무를 읽지 않았다. 여러 사람에게 읽으라고 권했지만, 정작 난 그 이의 이야기에 가슴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책을 펴지 못했다. 강해져야 한다고 언제나 되뇌지만 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
희망을 주러 갔다가 오히려 희망을 얻다
난 어떤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그 이가 모든 것을 걸고 크레인에 올라가 지키려 하는 이들, 김주익 열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들, 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랐고 그래서 1차 희망버스에 함께했다.
하지만 희망을 주러 갔다가 그곳에서 되레 희망을 받고 왔다는 이야기는 전혀 과장이 아니다. 수많은 나를 만났고, 수많은 김진숙을 만났다. 그래서 깨달게 된 것은 김진숙씨가 결코 혼자서 저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곳에 모인 많은 이들은 내가 어느 곳에 서서 싸움을 하든 그 싸움에 연대해올 누군가가 있으리라는 확신을 얻었다.
 |
희망버스가 그토록 사회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이 확신을 보았기 때문이고, 공권력과 한나라당이 입에 거품을 무는 것도 이런 연대의 확산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과 직종과 공장울타리를 넘었던 연대. 우리가 자본과 공권력보다 강할 수 있다면 그건 오로지 자신을 내어 놓는 연대 때문이지 않을까.
김진숙씨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수많은 열사들이 떠오른다. 그 열사들은 누군가는 자신을 따르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터다. 내가 나약한 것은 이 연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않은지 반성해본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연대하지 않았다는 반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이가 높은 크레인 위에 270일 넘도록 매달려 있다. 어느새 이 문장을 무덤덤한 채로 쓰게 된 내가 섬뜩하다. 그 숫자가 늘어갈수록 크레인 위에 애초 사람이 살고 있던 것 마냥, 한국사회에서 크레인 위 사람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 가는 게 두렵다.
지금 나에게 가을은 살을 에는 바람이 이는 겨울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의미이다. 힘이 더 모여야 한다. 나는 정말 간절히 이 글을 읽는 모든 이가 희망을 보태주기를 소원한다. 나를 더 강하게 벼려야한다고 되뇌면서, 희망버스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탈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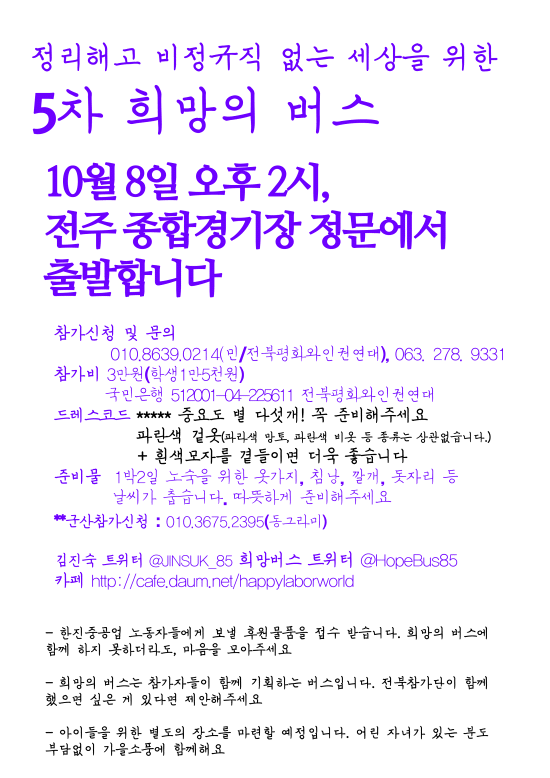 |
